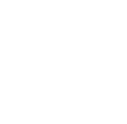궁지 몰린 디즈니+의 요금 인상, ‘美 잠잠·韓 반발’ 반응 갈리는 이유는?
디즈니+ 가격 인상 확정, 기존 요금제 4,000원 인상하고 하위 요금제 신규 출시 가격 인상은 월트디즈니 본사 실적 악화 영향? 2분기 미디어·엔터 부문 실적 부진 확인 美 시장은 가격 인상 순응·韓 시장은 반발, 시장 내 디즈니+ 영향력의 차이

수익성 확보 부문에서 난항을 겪던 글로벌 OTT 플랫폼 디즈니+가 결국 가격 인상을 확정했다. 디즈니+는 오는 11월 1일부터 구독 요금제를 △월 9,900원(연 9만9,000원)의 디즈니+ 스탠다드 △월 1만3,900원(연 13만,9000원)의 디즈니+ 프리미엄 두 가지 형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하고 하위 요금제를 신설하는 형태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달부터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졌으나, 시장 내에서 눈에 띄는 반발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미국 OTT 시장 내에서 디즈니+가 15%가량의 적지 않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최근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의 흥행을 기점으로 디즈니+가 겨우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국내 시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에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요금제 가격 인상, 하위 요금제 신설
오는 11월부터 디즈니+는 멤버십 유형에 따라 영상 화질, 오디오, 동시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기 수 등 기술 사양에 차이를 둘 예정이다. 스탠다드의 경우 영상 화질이 최대 풀 HD 1080p, 오디오는 최대 5.1, 동시 스트리밍 기기 수는 2개다. 프리미엄은 영상 화질이 최대 4K 울트라 HD & HDR, 오디오는 최대 돌비 애트모스, 동시 스트리밍 기기 수는 4개다. 두 요금제 모두 광고 송출은 없다.
1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구독자는 디즈니+ 프리미엄을 기존과 동일한 가격인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독을 취소하거나 변경 뒤 11월 1일 이후 재구독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멤버십 정책에 따라 1만3,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기존 멤버십 가격(월 9,900원)을 4,000원 인상하고, 기존 멤버십보다 영상 화질 등이 낮고 동시 스트리밍 가능 기기 수를 줄인 하위 등급 멤버십을 새로 추가하는 형태인 셈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디즈니+가 <무빙>과 같은 히트 콘텐츠를 앞세워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 7월 평균 25만 명 수준이었던 디즈니+의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무빙>이 흥행한 지난 8월 37만 명까지 급증했다. 디즈니+ 모바일 앱 주간 사용 시간 역시 무빙 공개 전인 8월 첫째 주(0.8억 분) 대비 130% 증가했다. 이에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는 시청자 기반을 갖춘 디즈니+가 때를 기다렸다는 듯 가격을 인상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월트디즈니 미디어 실적 악화, 가격 인상은 자구책?
하지만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월트디즈니 본사의 실적 악화에 있다. 월트디즈니는 올 초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직원 22만 명 중 약 3%(약 7,000명)를 내보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이후에도 실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분기 월트디즈니는 실적 발표를 통해 분기 매출 223억 달러(약 29조3,500억원), 영업이익 35억 달러(약 4조7,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손실은 4억6,000만 달러(약 6,145억원)에 달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엔데믹 진입 이후 급등한 테마파크(디즈니랜드) 매출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미디어 부문 매출은 140억 달러(약 19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8% 급감했다. 같은 기간 디즈니+ 구독자는 1억4,610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 7.4% 줄었다. OTT 가격 인상은 미디어 부문에서 위기에 봉착한 디즈니가 택한 일종의 수익 창출 전략인 셈이다.
이외에도 디즈니+는 최근 개봉한 디즈니와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을 시차 없이 OTT에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에서 6월 16일 개봉한 <엘리멘탈>을 개봉 3개월 만인 오는 9월 13일에 디즈니+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영화관에서 OTT로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가운데, 빠른 콘텐츠 확보를 통해 신규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장, 가격 인상에도 ‘얌전’한 이유는
한편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8월 디즈니+ 요금제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8월 각종 외신은 오는 10월부터 월트디즈니가 디즈니+ 구독 요금을 월 10.99달러(약 1만5,000원)에서 월 13.99달러(약 1만9,000원)로 27% 인상하고, 훌루(Hulu) 요금도 월 14.99달러(약 2만원)에서 월 17.99달러(약 2만4,000원)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월트디즈니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스트리밍을 위한 계정 공유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넷플릭스와 유사한 형태의 ‘계정 공유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의 반발은 국내 대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시장 반응의 온도차는 디즈니+가 각국 OTT 시장 내에서 보유한 영향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다. 앱 사용량 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분기 기준 국내 OTT 시장 1위 사업자는 넷플릭스다. 넷플릭스의 2분기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1,100만여 명에 달했으며, 이어 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가 400만~500만 명, 디즈니+ 180만 명 순이었다. 국내에서 디즈니+는 어디까지나 5위 사업자로, 소비자의 의존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무빙>의 흥행이 식고 나서 인상된 구독 요금이 가격이 소비자에게 용납될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 스트리밍 전문 검색 엔진 저스트워치가 2023년 1분기 미국 내 OTT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OTT 시장 내 점유율 1위는 아마존 프라임비디오(21%)로 나타났다. 이어 넷플릭스 20%, 디즈니+ 15% 순이었다. 미국 시장 내에서 디즈니+는 3위 사업자지만, 국내 대비 1·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가파른 폭으로 가격을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월트디즈니 본사의 자신감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전략이 먹힐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무빙> 외 이렇다 할 디즈니+ 오리지널 흥행작 IP가 없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소비자 사이에서는 ‘<무빙> 빼고는 볼 것도 없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가파른 폭의 가격 인상은 국내 시장에서 너무 섣부르다는 우려가 나온다.